Physical Address
13, Heolleung-ro 571-gil, Gangnam-gu, Seoul, 06376
Physical Address
13, Heolleung-ro 571-gil, Gangnam-gu, Seoul, 06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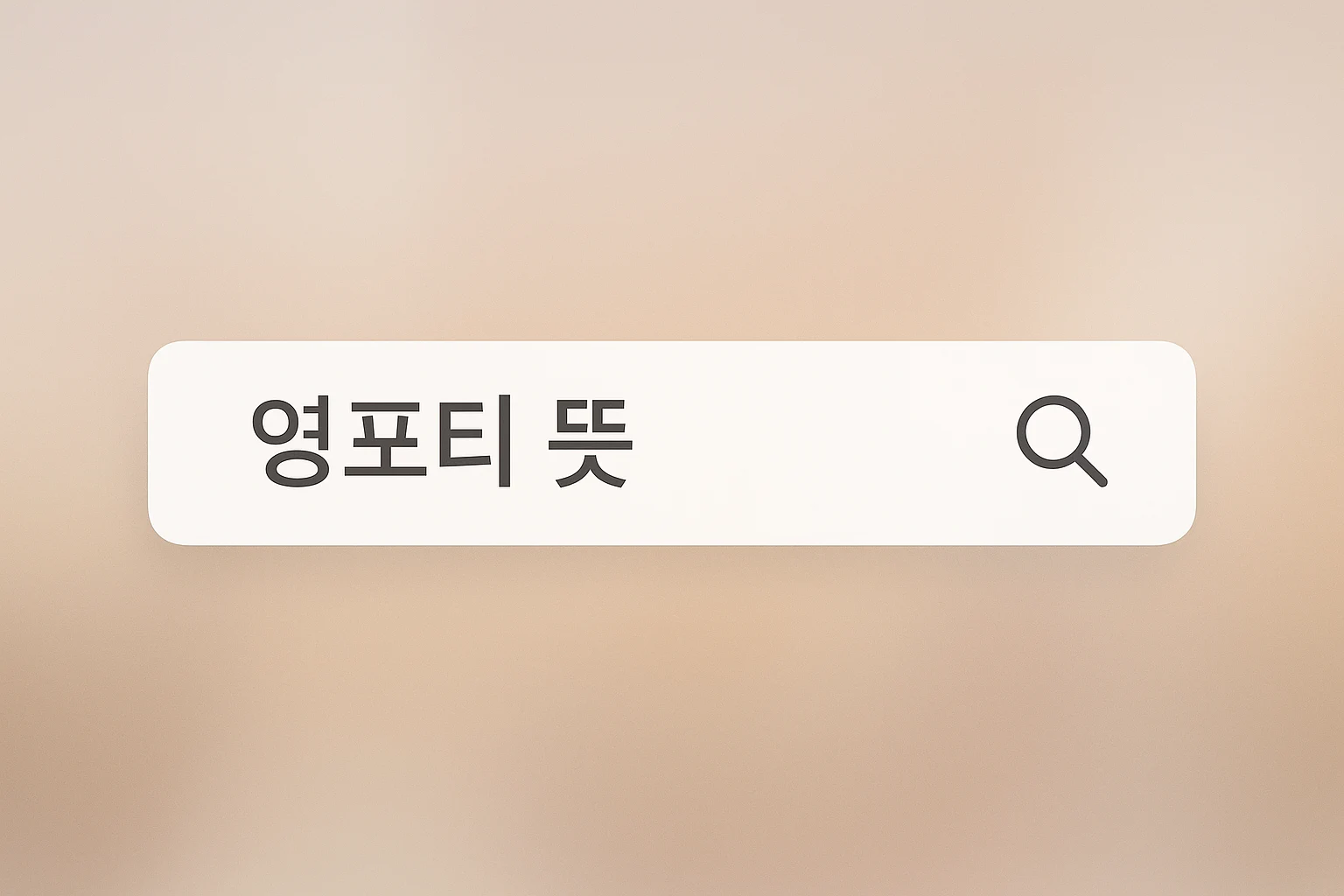
영포티는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중년의 소비와 자기계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 중반의 온라인 공간에서 영포티 뜻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도 사용되고 있다.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조롱이 공존하는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원래의 뜻과 최근의 현상을 나누어 살펴보자.
말 그대로 “Young Forty”, 직역하면 “젊은 40대”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젊게 보이는 40대를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 단어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 무렵 40대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과 자기 취향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원래의 영포티뜻은 ‘나이는 40대지만 여전히 20·30대 못지않은 감각을 지니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패션과 문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는 단순히 젊게 보이는 외모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문화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패션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며, 운동에서는 헬스와 골프, 러닝 같은 활동을 꾸준히 즐겼다. 문화적으로는 공연, 여행, 새로운 취미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소비시장에서도 이들은 중요한 고객층으로 부상했는데,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중시하는 주체로 주목받았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며 언급한 내용이 있다.
젊은 40대, ‘나는 영포티일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즉, 원래의 뜻은 단순히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40대를 넘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투자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긍정적 언어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멋진 중년’으로 정의했고, 사회도 이들을 새로운 소비 동력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쓰이는 맥락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히 멋진 중년을 가리키기보다, ‘젊어 보이려 안간힘을 쓰는 중년’이라는 풍자적 뉘앙스를 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경제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온라인에서 ‘영포티’가 언급된 글들 중 부정적 키워드가 55.9%로, 긍정적 키워드(37.6%)보다 더 많았다. 이 수치는 이 단어를 소비하는 대중의 인식이 긍정보다 부정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롱의 방식은 구체적이다. 예컨대 브랜드 로고가 크게 새겨진 옷을 입거나, 최신 스마트폰과 액세서리를 과시하는 40대의 모습은 일명 “영포티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밈화되곤 한다. 뉴에라 모자와 슈프림·스투시 티셔츠, 나이키 농구화 등을 착용한 모습이 대표적이다. 원래라면 자기관리와 멋의 표현으로 이해되었을 소비 패턴이, Z세대에게는 “과한 허세”로 읽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대 간 시각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Z세대가 중시하는 키워드는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이다. 이들은 브랜드나 겉모습보다 ‘맥락’과 ‘스토리’를 본다. 그런데 중년들이 흔히 선택하는 강렬한 로고 플레이나 화려한 아이템은 오히려 “억지로 젊은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원래의 영포티뜻은 긍정의 상징에서 ‘민폐 꼰대형 이미지’로 겹쳐 읽히게 된 것이다.
패션 뿐 아니라, 정치와 소비 성향, 소통 방식 등이 한데 묶여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포티 스타터팩”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된 이미지에는 김어준, 노재팬, 남패미 등과 관련된 사진이 모여있다.
이처럼 이 단어는 오늘날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행동이라도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헬스장에 다니고 러닝을 즐기는 40대를 어떤 이는 ‘멋진 자기관리형 영포티’라 부르고, 어떤 이는 ‘늦게 철 든 영포티’라며 비꼰다. 브랜드 아이템을 착용한 모습 역시 누군가에겐 세련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허세’로 읽힌다.
맥락과 세대에 따라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양가적 언어가 된 것이다. 이처럼 영포티는 앞으로도 서로 다른 의미로 많이 쓰여지며 세대 간 인식 차이와 문화적 맥락이 충돌하는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은 아닐까?